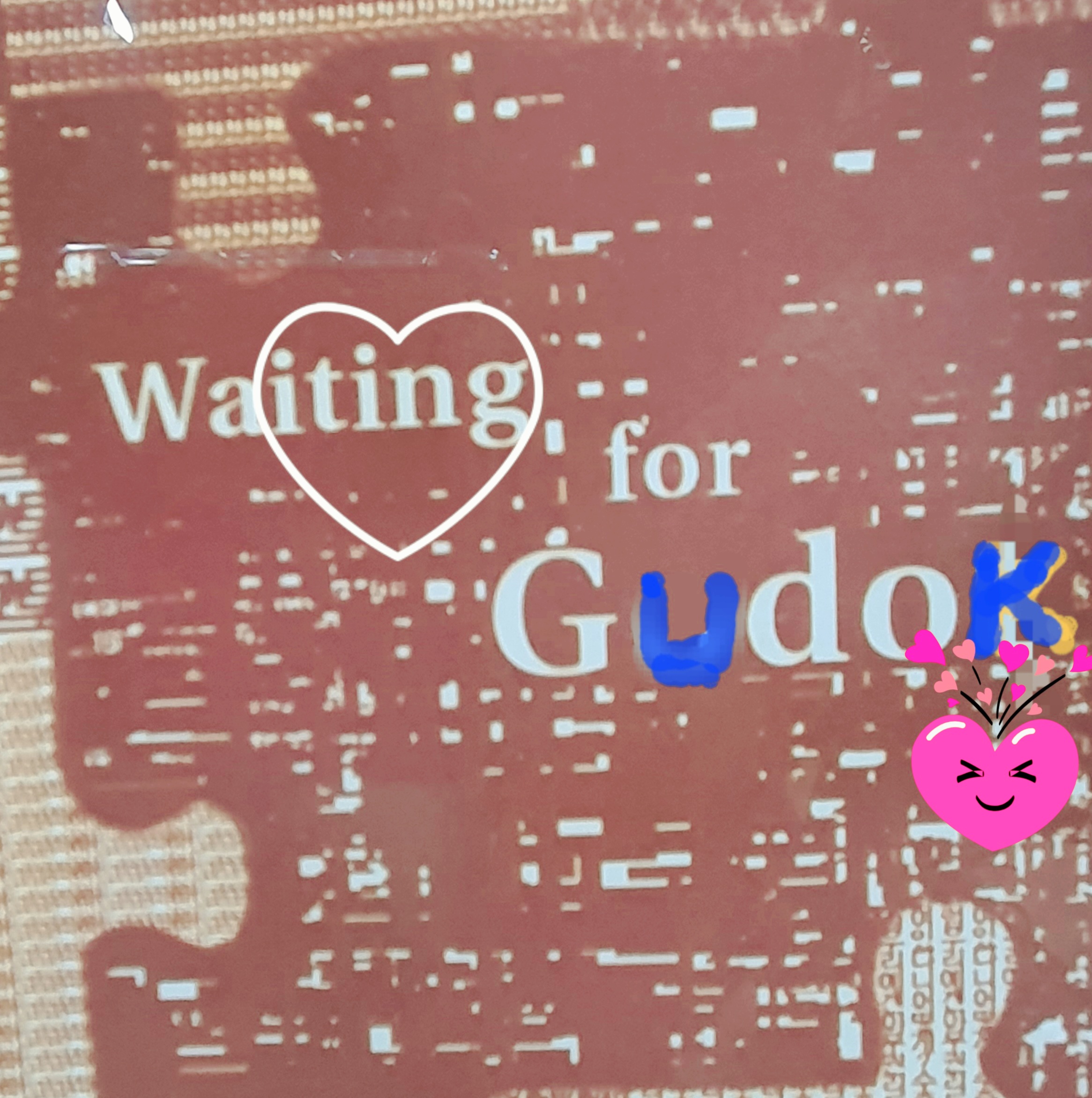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윌리엄 포크너
- 월터 스콧
- 논술
- 랍비 뜻
- 존 드라이든
- 명작의 첫문장
- 선화봉사고려도경
- 서긍
- 프란츠 카프카
- 투르게네프
- 명작의 첫 문장
- 나는 고발한다
- 팡테옹
- 귄터 그라스
- 이인로 파한집
- 플로베르
- 빅토르 위고
- 베르길리우스
- 클리셰 뜻
- 명작의첫문단
- 에밀 졸라
- 우신예찬
- 명작의 첫문단
- 명작의 첫 문단
- 우암 송시열
- 노벨문학상
- 헨리제임스
- 부관참시
- 찰스 디킨스
- 송강 정철
- Today
- Total
명작의 첫문단과 작가 이야기
삼국사기-현전(現傳) 최고 사서의 도입부는 신이(神異)한 일의 관찰 서술로 시작된다. 본문
“신라본기 제1 시조(始祖) 혁거세거서간(赫居世居西干)=시조의 성(性)은 박씨(朴氏)요, 휘(諱)는 혁거세(赫居世)이다. 전한(前漢) 효선제(孝宣帝) 오봉(五鳳) 원년(元年) 갑자(甲子) 4월 병진일(혹은 정월15일이라고 함)에 즉위하니 명칭은 거서간이요. 나이는 13세였다. 국호(國號)를 서나벌(徐那伐)이라 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遺民)이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아 여섯 마을을 이루었다. 첫째가 알천(閼川)의 양산촌(楊山村), 둘째가 돌산(突山)의 고허촌(高墟村), 셋째가 취산(鷲山)의 진지촌(珍支村, 혹은 于珍村이라고도 함), 넷째가 무산(茂山)의 대수촌(大樹村), 다섯째가 금산(金山)의 가리촌(加利村), 여섯째가 명활산(明活山)의 고야촌(高耶村)이다. 이것을 진한(辰韓)의 육부라고 하였다. 고허촌장 소벌공(蘇伐公)이 양산(楊山) 기슭 나정(蘿井) 옆의 수풀 사이에서 말이 무릎 꿇고 울부짖는 것을 보고 쫓아갔다. 어느새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이 하나 있어서 그 알을 쪼개자 어린아이가 나왔다.”(신호열 역해, 동서문화사, 2007)

1.전형적인 역사 서술 방식의 도입부다. 한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방식으로 설화와 신화를 관찰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고대 나라 건국의 신이(神異)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성과 어린 나이의 지도자를 통해 신성(神性)을 부여했고, 백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물과 말, 알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은 기본적인 국가 체제가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책 사업으로 나라 역사를 편찬하면서 굳이 중국 연호를 쓴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한 효선제(한나라 9대 황제) 오봉(연호) 원년은 기원전 57년이다.
2.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 1145)’는 고려 제17대 대왕 인종(仁宗, 1109~1146, 재위 1122~1146) 때 나온 대한민국에서 현존 가장 오랜 된 사서(史書)다.
한민족 역사를 다룬 책 중 현존 가장 오래된 정사(正史)다. 인종의 명으로 국가적 지원 아래 나온 관찬(官撰) 역사서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 관찬 사서 편찬의 선구적 위치에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삼국사기 원본은 전하지 않는다. 또 고려시대 판본도 극히 일부만 전해진다.
조선 개국 직후인 1393~1394년 사이 진의귀(陳義貴, ?~1424, 고려말 조선 초 문신)와 김거두(金居斗,1338~?)가 고쳐 펴낸 책도 완질본(完帙本) 원본은 없다. 조선 1512년(중종 7년)에 이계복이 다시 고쳐 쓴 판본 등이 완질본으로 남아 있다.
3.삼국사기는 승려이자 권력가(인종의 왕실 고문)인 묘청(妙淸, ?~1135)의 난(1135∼36)이 진압된 이후 10여 년 만에 출판됐다.
이는 고구려 계승을 주장하는 서경(평양) 세력이 몰락하고, 신라 정통론의 경주 문벌 귀족이 권력을 완전 장악한 이후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찬 책임자는 당대의 권력 실세로 문하시중을 지낸 경주문벌세력의 대표자 경주김씨 김부식(金富軾)이며, 10여 명이 보조 역할을 했다.
참고(叅考, 편찬 보조)로는 고려 중기 문신인 김영온(金永溫), 최우보(崔祐甫, 1105~1170), 이황중(李黃中), 박동계(朴東桂), 서안정(徐安貞), 허홍재(許洪材,?~1170), 이온문(李溫文), 최산보(崔山甫,?~1228)가 참여했다. 또 관구(管勾, 편찬 행정사무)로 김충효(金忠孝), 정습명(鄭襲明, 1096~1151) 등이 행정 실무를 맡았다.
조선 초 중간본 편찬 참여자는 여말선초 문신 김거두(金居斗,1338~?), 최득경(崔得冏), 민개(閔開, 1360~1396) 등이다.

4.삼국사기는 고려의 문벌귀족 문화가 절정기에 달할 때 편찬됐다. 당시는 외척세력 이자겸(李資謙, 1160년 전후?~1126)의 난(1126년, 인종 4년)과 묘청의 난이 진압된 이후 체제가 안정됐지만 여진족의 위협 등이 팽배했을 때이기도 하다.
기전체(紀傳體, 인물 중심 역사 서술 방식)로 ‘본기(本紀)’가 있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삼국사기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 자주성을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다.
‘정통성을 가진 국가(제후국이 아닌 독립된 나라 또는 황제국)’ 역사인 본기를 구성했고, 삼국을 대등하게 다룬 것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 본기가 있다. 조선 초에 나온 ‘고려사’만 해도 본기가 없고, 제후국 역사서의 서술방식인 ‘세가(世家)’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총 31편의 사론(史論)도 있다. 본기에 23편, 열전에 8편의 사론이 실려 있다. 이 사론을 통해 편찬 책임자 김부식의 역사 인식을 볼 수 있다.
5.책은 본기(本紀), 연표(年表), 지(志), 열전(列傳)으로 구성됐다. 본기는 총 28권으로 신라 본기 12권(1~12권), 고구려 본기 10권(13~22권), 백제 본기 6권(23~28권)이다. 연표는 중국식이며, 중국 왕조 연호를 택했고, 삼국의 왕계는 표로 작성했다. 총 3권(29~31권이다.
지는 삼국의 제도, 문화, 지리 등 여러 가지를 섞어놓은 잡지다. 9권(32~40권)이다. 1권은 제사(祭祀), 악(樂), 2권은 색복(色服), 거기(車騎), 기용(器用), 옥사(屋舍), 3~6권은 지리(地理), 7~9권은 직관(職官)을 썼다. 지는 아쉽게도 신라 중심, 삼국 통일기의 상태를 서술했다.
열전은 인물 69명의 전기(傳記) 형태로 수록돼 있다. 1~3권이 김유신(金庾信,595~673, 신라 장군, 추존 흥무왕). 나머지 7권은 삼국의 충효, 화랑, 문인(文人), 반역인(叛逆人) 등의 전기(傳記)다.
6.중국에는 남송(1127~1279) 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려 사신이 1174년(명종 4) 삼국사기를 송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13세기 문헌인 ‘옥해(玉海)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옥해(玉海)는 남송 학자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의 저서다.
러시아에도 전해졌다. 1760년(영조 36)경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 판본이다. 러시아과학원 동방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그지부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삼국 사기의 유일한 서양 언어 번역본은 1959년과 2001년에 나눠 출간된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박(Mikhail Nikolaevich Pak)의 러시아 판이다.
#. 삼국사기 판본

1.옥산서원본(玉山書院本)=총 50권 9책 완질본이다. 조선 중종 7년, 1512년에 개각한 목판으로 선조6년(1573) 8월에 경주부(慶州府)에서 찍은 것이다. 옥산서원은 영남의 최대 서원 중 하나로 유학자로 대사헌을 지낸 이언적(李彦迪,1491~1553)을 배향한 곳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原板)과 조선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 중종 때 다시 개각한 것 등 3종의 판(板)이 종류별로 섞여 있다.
현대에 와서 편주(編註,편찬시 해석을 다는 것)해 나온 삼국사기 대부분이 이 옥산서원본이 바탕이다. 국보 제322-1호로 지정돼 있다.

2.정덕본(正德本)=총 50권 9책 완질본. 조선 중종 7년 1512년에 경주부(慶州府)에서 간행한 것으로 정덕본 혹은 경주부 간본(刊本)이라고 한다. 계유년(1393년) 7월에 착수, 갑술년(1394년) 4월에 마친 인쇄본이다.
옥산서원본과 정덕본에는 조선 태조 3년(1394)에 처음 개각(改刻)할 당시 경주 부사 김거두가 쓴 발문과 두 번째 개각 때인 중종 7년(1512) 경주부윤 이계복 발문이 있다. 옥산서원본과 함께 완질본이다. 2018년 2월 국보 제322-2호로 지정돼 있다. 서울 중구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3.성암본(보물 제722호)= 삼국사기 권44∼50이 있는 총 7권 1책이다. 1981년 서울 중구 성암고서박물관에서 발견해 성암본이라고 한다. 13세기 후기에 찍은 현존 가장 오랜 삼국사기이지만 극히 일부(1책)만 전해진다. 삼국사기 초간본의 후쇄본(後刷本)을 가지고 복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4.일본 궁내청본=정덕본을 수정, 가필한 1981년 2월 궁내청 서원부(황실도서관)에서 발견됐다. 50권 9책 완질본이다. 궁내청 황실도서관 사서 정리를 1870년에 한 만큼 그 이후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한다.
5.삼국사기 현대 출판본은 1994년 홍신문화사에서 최호 역으로 ‘삼국사기1(신역)’, ‘삼국사기2(신역)’로 간행됐다. 또 1995년에는 신서원에서 고전연구실 역으로 ‘삼국사기(상)’, ‘삼국사기(하)’로 나왔다. 이해에는 또 명문당에서 김종권 역으로 ‘삼국사기(상)’, ‘삼국사기(하)’로 출판됐다.
현대 한국어 번역본은 국사편찬위원회(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웹사이트에서 한글과 원문을 제공되고 있다.

#. 김부식(金富軾, 1075~1151)=고려 중기 문신이자 학자. 한림학사와 문하시중. 시호는 문열공(文烈公)이며, 작위는 낙랑군 개국후(樂浪郡 開國侯)이다. 무신정변(武臣政變, 고려 의종 24년, 1170년에 일어난 정중부의 난)이후 정중부(鄭仲夫, 1106~1176) 정권에 의해 부관참시 당했다.
1.증조 할아버지인 김위영(金魏英)은 왕건에게 충성을 바친 공로로 경주의 주장(州長)이 되어 경주를 다스리는 토호였다.
다만 할아버지 김원충(金元冲)과 아버지 김근(金覲)은 개경에서 문신을 지냈다. 아버지는 예부시랑(禮部侍郞)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을 지냈지만 일찍 사망했다.
그런데 김부식과 형제(5명?)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 다만 아들 김돈중(金敦中, 1119 ~ 1170년)과 김돈시(金敦時, ?~1170) 둘 다 무신정변 때 처형당한다.

2.신라 정통론을 계승한 개경 문벌 대표자다. 1132년 수사공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守司空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에 올랐다. 이어 묘청(妙淸, ?~1135)의 난(1135∼1136, 서경을 근거지로 일어난 반란) 때 로 왕당파 총대장(원수)을 맡아 평정했다.
서경 진압 작전 이전에 개경에 있던 온건 서경파인 정지상(鄭知常, ?~1135, 서경파 문신이자 시인)·김안(金安)·백수한(白壽翰, 1081~1135, 고려조정 일관, 묘청 제자) 등을 처단하고 출정해 현대에 와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묘청의 난 진압후 수충정난정국공신(輸忠定難靖國功臣)에 책록되고 검교태보 ·수태위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감수국사 ·상주국 겸 태자태보(檢校太保守太尉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監修國事上柱國兼太子太保)에 승진했다. 직후 문하시중을 지낸 윤관(尹瓘, 1040~ 1111)의 아들이자 최대 정적(政敵)인 윤언이(尹彦頥, 1090~1149)을 광주 목사로 좌천시키고, 정권을 완전 장악했다. 이어 1138년에 검교태사 ·집현전대학사 ·태자태사(檢校太師集賢殿太學士太子太師)에 올랐다.
3.문신 권력자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꼽힌다. 무신정변은 김부식 사망 후 20여 년이 지난 1970년에 일어나지만 생전에 아들 김돈중이 견룡대정(왕실을 지키는 근위대) 정중부 장군의 수염을 촛불로 태운 사건이 났다.
이 사건에서 김부식이 아들을 두둔, 정중부와 쌍방처벌을 하는 사태로 발전해 무신들의 불만이 쌓인 것이다.
이후 의종(毅宗, 고려 제18대 대왕, 1127~1173)과 문신 한뢰(韓賴,1140?~1170, 종5품), 김돈중 등이 1170년 의종의 개경 인근 보현원 행차 때 무신을 희롱하면서 무신정변이 발생했다. 당시 한뢰가 무신의 빰을 때리면서 무신들이 문신 타도에 나선 것이다.

4.1142년(인종 18) 은퇴했다. 정계 은퇴 후 왕명으로 삼국사기 편찬 책임자로 활약했다. 1145년 삼국사기 편찬 이후에는 개경 인근 관란사(觀瀾寺)에서 수행하다가 1151년 영면한다.
하지만 사망 19년 후 일어난 무신정변으로 부관참시(剖棺斬屍, 무덤에서 관을 꺼내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것)를 당한다.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현전하지 않는다.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약칭 고려도경,)’에 김부식의 집안 내력이 나와 중국에서도 유명했다고 한다.
서긍은 김부식에 대해 “박학강식(博學強識)해 글을 잘 짓고, 고금을 잘 알아 학사의 신복을 받으니, 그보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썼다.(콘텐츠 프로듀서)